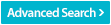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최근 8년간 중증응급을 포함한 응급환자의 발생과 이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인천공항소방대 구급대원이 등록한 출동 및 처치기록의 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구급대의 처치기록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 등록되기 시작된 시점인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1일까지 8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여 인천국제공항 구급대에 의해 처치된 환자 중, 기록지에 ‘응급’으로 분류 등록된 환자로 최종 8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IRB 승인(KNU_IRB_2022-078)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의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등록된 전체 환자는 10,354건이었으며, 중증도 ‘응급’으로 분류 등록된 환자 데이터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연구변수 항목을 엑셀 확장자명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증도에 ‘응급’으로 분류 등록된 환자는 888건이었으며, 이 중 재이송 되어 같은 환자의 중복이 발생한 77건과 성별, 연령대, 내외국인, 주 증상 등 전체적으로 기록이 미흡한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810건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엑셀 확장자명으로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국적, 발생장소, 의식수준, 질병분류를 추출하였다.
2) 이송 관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송종류, 지도의사 동승 유무, 이송 병원의 유형, 현장 도착시간, 현장 체류시간, 이송시간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IBM SPSS Statistics Ver. 25.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송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구급활동에 걸린 시간은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값을 구하였으며 구간을 범주화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반적 특성과 이송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 중앙값을 구하였다.
3) 발생장소에 따른 현장 도착시간, 현장 체류시간, 이송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값으로 구하였다.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의 차이는 비모수 검정인 Mann Whitney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65.6%(531명)로 여자 34.4%(278명)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50대가 19.5%(151명)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3%(18명)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50.41±19.73으로 확인되었다. 국적은 내국인이 64.1%(516명)로 외국인 35.9%(289명)보다 높았다.
발생장소를 크게 여객 터미널 내와 여객 터미널 외로 나누어 봤을 때 여객 터미널 내의 보호구역이 42.1%(341명)로 가장 높았고 여객 터미널 외 일반구역이 2.8%(23명)로 낮게 나타났으며 공항의료센터에 직접 내원하여 발생한 환자는 32.2%(261명)이었다.
의식수준은 명료한 상태가 66.5%(539명)로 가장 높았고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환자는 9.1%(74명)로 가장 낮았다. 질병분류로는 질병이 86.2%(698명)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10)
|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 |
|
Gender*
|
Male |
531 |
(65.6) |
|
|
Female |
278 |
(34.4) |
|
|
Age*
|
Less than 10s |
38 |
(4.9) |
|
|
10s |
18 |
(2.3) |
|
|
20s |
50 |
(6.4) |
|
|
30s |
119 |
(15.3) |
|
|
40s |
125 |
(16.1) |
|
|
50s |
151 |
(19.5) |
|
|
60s |
132 |
(17.0) |
|
|
70s |
98 |
(12.6) |
|
|
More than 80s |
45 |
(5.8) |
|
|
(Mean±SD) |
(50.41±19.73) |
|
|
Nationality*
|
Domestic |
516 |
(64.1) |
|
|
Foreigner |
289 |
(35.9) |
|
|
Occurrence location |
Passenger terminals |
Airport medical center |
261 |
(32.2) |
|
|
Protected area |
341 |
(42.1) |
|
|
General area |
132 |
(16.3) |
|
|
Outside of terminals |
Protected area |
53 |
(6.5) |
|
|
General area |
23 |
(2.8) |
|
|
Levels of consciousness |
Alert |
539 |
(66.5) |
|
|
Verbal response |
96 |
(11.9) |
|
|
Pain response |
74 |
(9.1) |
|
|
Unresponsive |
101 |
(12.5) |
|
|
Disease classification |
Illness |
698 |
(86.2) |
|
|
Non-Illness |
112 |
(13.8) |
2. 이송 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이송 기관의 특성
응급환자의 이송 종류는 현장이송이 64.2%(520명), 공항의료센터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의미하는 의료기관 간 이송은 32.2%(261명), 미이송은 3.6%(29명)이었다.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95.9%(749명)이었고, 그 외의 이송은 4.1%(32명)로 여기에는 119 인계, 사설구급차 인계, 헬기 인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 시 지도의사가 동승한 경우는 34.2%(256명)이었다.
이송한 병원의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67.4%(505명)로 가장 높았고, 공항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도 27.6%(207명)이었다<
Table 2>.
Table 2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10)
|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 |
|
Transfer type |
On-site transfer |
520 |
(64.2) |
|
|
Inter-hospital transfer (Airport medical center-hospital) |
261 |
(32.2) |
|
|
Do not transfer |
29 |
(3.6) |
|
|
Transportation hospital (n=781) |
Yes |
749 |
(95.9) |
|
|
Others |
32 |
(4.1) |
|
|
Accompanied by a doctor (n=749) |
Yes |
256 |
(34.2) |
|
|
No |
493 |
(65.8) |
|
|
Type of transportation hospital (n=749) |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
505 |
(67.4) |
|
|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
21 |
(2.8) |
|
|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
15 |
(2.0) |
|
|
Airport medical center |
207 |
(27.6) |
|
|
Others(clinic) |
1 |
(0.1) |
2) 대상자의 구급 활동 시간
환자가 발생한 현장까지 도착한 시간은 평균이 5.3±3.7분이고 중앙값은 4(3∼7)분이었으며, 구간별로는 5분 이하가 63.8%(51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장 체류시간의 평균은 12.5±11.6분이었으며, 중앙값은 9(5∼16)분이었고, 구간별로는 5분∼10분이 29.5%(239명), 5분 이하가 28.1%(228명), 10분∼20분이 27.0%(219명)이었고, 20분 초과한 경우는 15.3%(124명)로 가장 낮았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의 경우는 평균이 33.0±27.8분이고 중앙값은 29(16∼40)분이었으며, 구간별로 30분을 초과한 경우가 45.3%(339명)로 가장 높았다<
Table 3>.
Table 3
Prehospital airport paramedic response time (N=810)
|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 |
Mean±SD |
Median(Q1∼Q3) |
|
Scene arrival time |
≦5 |
517 |
(63.8) |
5.3±3.7 |
4(3∼7) |
|
|
5∼10 |
258 |
(31.9) |
|
|
10< |
35 |
(4.3) |
|
|
Scene stay time |
≦5 |
228 |
(28.1) |
12.5±11.6 |
9(5∼16) |
|
|
5∼10 |
239 |
(29.5) |
|
|
10∼20 |
219 |
(27.0) |
|
|
20< |
124 |
(15.3) |
|
|
Transport time (n=749) |
≦10 |
127 |
(17.0) |
33.0±27.8 |
29(16∼40) |
|
|
10∼20 |
90 |
(12.0) |
|
|
20∼30 |
193 |
(25.8) |
|
|
30< |
339 |
(45.3) |
3. 국적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이송 관련 특성
대상자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과 이송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
Table 4>과 같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transportation of patient by nationality (N=810)
|
Characteristics |
Category |
Domestic |
Foreigner |
|
|
|
n(%) |
n(%) |
|
Gender |
Male |
343(66.5) |
184(63.7) |
|
|
Female |
173(33.5) |
105(36.3) |
|
|
Age |
Less than 10s |
22(4.4) |
16(5.7) |
|
|
10s |
13(2.6) |
5(1.8) |
|
|
20s |
36(7.2) |
14(5.0) |
|
|
30s |
73(14.7) |
46(16.5) |
|
|
40s |
82(16.5) |
43(15.4) |
|
|
50s |
103(20.7) |
48(17.2) |
|
|
60s |
93(18.7) |
39(14.0) |
|
|
70s |
53(10.7) |
45(16.1) |
|
|
More than 80s |
22(4.4) |
23(8.2) |
|
|
(Mean±SD) |
(49.77±19.03) |
(51.55±20.90) |
|
|
Occurrence location |
Passenger terminals |
Airport medical center |
173(33.5) |
88(30.4) |
|
|
Protected area |
197(38.2) |
143(49.5) |
|
|
General area |
76(14.7) |
54(18.7) |
|
|
Outside of terminals |
Protected area |
50(9.7) |
1(0.3) |
|
|
General area |
20(3.9) |
3(1.0) |
|
|
Levels of consciousness |
Alert |
370(71.7) |
167(57.8) |
|
|
Verbal response |
61(11.8) |
35(12.1) |
|
|
Pain response |
40(7.8) |
34(11.8) |
|
|
Unresponsive |
45(8.7) |
53(18.3) |
|
|
Type of transportation hospital |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
326(63.2) |
177(61.2) |
|
|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
19(3.7) |
2(0.7) |
|
|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
15(2.9) |
0(0.0) |
|
|
Airport medical center |
116(22.5) |
90(31.1) |
|
|
Others(clinic) |
40(7.8) |
20(6.9) |
|
|
|
Median(Q1∼Q3) |
Median(Q1∼Q3) |
|
|
Prehospital airport paramedic response time |
Scene arrival time(min) |
4(3∼7) |
5(3∼7) |
|
|
Scene stay time(min) |
9(5∼15) |
10(5∼17) |
|
|
Transport time(min) |
29(21∼39) |
28(13∼41) |
성별은 내국인의 66.5%(343명), 외국인의 63.7%(184명)가 남자였고, 연령대는 내국인의 경우 50대가 20.7%(103명)로 가장 높았고, 60대(18.7%, 93명), 40대(16.5%, 82명)순이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49.77±19.0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50대가 17.2%(48명)로 가장 높았고, 30대(16.5%, 46명), 70대(16.1%, 45명)순이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51.55±20.90로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여객 터미널 내 보호구역이 가장 많았고, 각각 38.2%(197명), 49.5%(143명)를 나타냈다.
의식수준은 내·외국인 모두 명료한 상태가 가장 많아, 내국인의 71.7%(370명), 외국인의 57.8%(167명)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반응없음이 18.3%(53명)로 나타나 내국인의 8.7%(45명)에 비해 높았고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환자도 외국인은 11.8%(34명)인 반면, 내국인은 7.8%(40명)로 나타났다.
이송 병원의 유형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많았고 각각 63.2%(326명), 61.2%(177명)이었다.
구급 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내국인 환자가 발생한 현장까지 도착한 시간은 중앙값 4(3∼7)분, 현장 체류시간은 중앙값 9(5∼15)분이고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은 중앙값 29(21∼39)분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환자가 발생한 현장까지 도착한 시간은 5(3∼7)분, 현장 체류시간은 중앙값 10(5∼17)분이고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은 중앙값 28(13∼41)분이었다.
4. 발생장소에 따른 구급 활동 시간의 차이
1) 대상자의 발생장소에 따른 현장 도착시간의 차이
응급환자의 발생장소에 따른 환자가 발생한 현장까지 도착한 시간의 평균값은 여객 터미널 내 공항의료센터가 4.4±0.2분이었고 보호구역은 5.8±0.2분, 일반구역은 5.2±0.4분이었으며, 여객터미널 외에서 보호구역은 6.6±0.6분이었고 일반구역은 6.7±0.7분이었다.
여객 터미널 내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에 공항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z=-3.444,
p=.001), 보호구역이 중앙값은 5(4∼7)분으로 일반구역의 중앙값 4(3∼6)분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터미널 외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z=-.774,
p=.439) <
Table 5>.
Table 5
Differences Scene arrival time based on the patient occurrence location (N=810)
|
Occurrence location |
Scene arrival time(min) |
z
|
p
|
|
|
Mean±SD |
Median(Q1∼Q3) |
|
Passenger terminals |
Airport medical center |
4.4±0.2 |
3(3∼6) |
|
|
|
|
Protected area |
5.8±0.2 |
5(4∼7) |
-3.444 |
.001 |
|
|
General area |
5.2±0.4 |
4(3∼6) |
|
|
Outside of terminals |
Protected area |
6.6±0.6 |
5(4∼9) |
-.774 |
.439 |
|
|
General area |
6.7±0.7 |
7(5∼8) |
2) 대상자의 발생장소에 따른 현장 체류시간의 차이
응급환자의 발생장소에 따른 현장 체류시간의 평균값은 여객 터미널 내 공항의료센터가 13.3±0.5분이었고 보호구역은 14.5±0.7분, 일반구역은 6.7±0.7분이었으며, 여객터미널 외에서 보호구역은 10.0±1.1분이었고 일반구역은 12.3±3.3분이었다.
여객 터미널 내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의 구급대 현장 체류시간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으며(z=-8.145,
p=.000), 보호구역이 중앙값은 10(5∼19)분이고 일반구역의 중앙값은 4(2∼7)분이었다. 여객 터미널 외에서는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624,
p=.532)<
Table 6>.
Table 6
Differences Scene stay time based on the patient occurrence location (N=810)
|
Occurrence location |
Scene stay time(min) |
z
|
p
|
|
|
Mean±SD |
Median(Q1∼Q3) |
|
Passenger terminals |
Airport medical center |
13.3±0.5 |
11(8∼16) |
|
|
|
|
Protected area |
14.5±0.7 |
10(5∼19) |
-8.145 |
.000 |
|
|
General area |
6.7±0.7 |
4(2∼7) |
|
|
Outside of terminals |
Protected area |
10.0±1.1 |
7(5∼13) |
-.624 |
.532 |
|
|
General area |
12.3±3.3 |
6(4∼12) |
3) 대상자의 발생장소에 따른 이송시간의 차이
응급환자의 발생장소에 따른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의 평균값은 여객 터미널 내 공항의료센터가 33.1±0.9분이었고 보호구역은 33.6±1.6분, 일반구역은 29.5±4.3분이었으며, 여객터미널 외에서 보호구역은 38.8±3.5분이었고 일반구역은 28.2±5.0분이었다.
여객 터미널 내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에서 병원까지 걸린 이송시간의 차이는 유의차가 있었으며(z=-3.623, p=.000), 보호구역의 중앙값은 26(12∼48)분으로 일반구역의 중앙값 21(4∼41)분보다 더 길게 소요되었다.
여객 터미널 외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에서도 병원 이송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2.074,
p=.038), 보호구역의 중앙값은 35(28∼48)분으로 일반구역의 중앙값 26(8∼36)분보다 더 길게 소요되었다<
Table 7>.
Table 7
Differences transfer time based on the patient occurrence location (N=749)
|
Occurrence location |
Transfer time(min) |
z
|
p
|
|
|
Mean±SD |
Median(Q1∼Q3) |
|
Passenger terminals |
Airport medical center |
33.1±0.9 |
30(26∼36) |
|
|
|
|
Protected area |
33.6±1.6 |
26(12∼48) |
-3.623 |
.000 |
|
|
General area |
29.5±4.3 |
21(4∼41) |
|
|
Outside of terminals |
Protected area |
38.8±3.5 |
35(28∼48) |
-2.074 |
.038 |
|
|
General area |
28.2±5.0 |
26(8∼36) |
Ⅳ. 고 찰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특성과 이송 현황을 파악하여 공항 내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공항구급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을 등록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로 이때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공항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중증도에 ‘응급’으로 분류 등록된 건은 총 810건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발생환자의 65.6%가 남자였고, 연령대는 평균이 50.41대로, 50대가 19.5%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가 전체의 67.9%를 차지하였다. 119 구급통계에 따르면, 119에 의해 이송된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51.4%가 남자였고, 연령대는 60대가 17.1%로 가장 높았고, 70대(15.7%), 50대(15.1%), 80대(14.3%)순으로 50대 이상이 65% 이상을 차지하여[
10] 공항에서 발생한 환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즉, 공항에서 발생한 환자의 경우 남성 비율이 일반보다 높은 편이고 연령대도 비교적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제공항이라는 특성으로 외국인이 전체 대상자의 35.9%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의식상태는 통증자극에 반응과 반응없음이 각각 11.8%(34명)와 18.3%(53명)로 내국인의 경우 7.8%(40명), 8.7%(45명)보다 높아, 외국인에서 중증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발생장소에 있어서도 이송에 제한이 있는 여객터미널 내 보호구역이 49.5%(143명)로 내국인 38.2%(197명)보다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일수록 현장에서 신속한 환자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일 경우 응급의료서비스 진행 중 언어적인 제한점에 의해 환자 상태 파악이 늦어지는 경우나 가변형 들것 등 구급차 장비사용에 대한 신체적인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11]. 그러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 환자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Kim[
12]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 발생장소의 특수성에 따른 효율적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하며, 환자의 중증도와 이송 목적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환자 이송체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내국인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더 높은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하게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언어적, 신체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 개발 등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여객터미널 내에서 주로 발생했고, 그중에서 보호구역이 341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항의료센터가 32.2%(261명)이었다. 여객터미널 내 일반구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보행이 가능하면 쉽게 공항의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료센터에서 처치가 불가능하고 응급으로 분류되어 공항구급대를 통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서비스 개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3]. 본 연구에서는 응급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보호구역에서는 현장 도착시간(
p=.001), 현장 체류시간(
p=.000), 이송시간(
p=.000)이 모두 일반구역보다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119에 신고를 하더라도 119가 보호구역으로 가는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항구급대에게 협조요청을 하게 되며, 공항구급대가 환자를 119에 인계하거나 직접 이송하게 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별도의 공항의료센터 등 응급환자를 담당할 의료진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호구역 출입 권한이 있는 인천공항소방대 구급대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항공기가 주기장과 활주로로 상호 이동을 하게 되는 구역들이 존재하는데[
7], 항공기가 지상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 구역을 지나는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이 이동을 잠시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도착시간이 일반구역보다 늦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항공기 내에서 응급환자(입국 예정자, 출국 예정자, 승무원 등)가 발생할 경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구급상황실로 출동요청이 들어오고 공항구급대는 도착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보호구역 내 환자들이 입국 예정자인지, 출국 예정자인지, 승무원인지 등 구체적 분석이 어려워, 추후 이러한 분석으로 현장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에서 이송시간이 길어졌던 이유로는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데에 있어서 출입국 취소, 세관 관련 등 보안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에게는 공항의 출입국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송시간은 비록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에서도 평균 33.0분 중앙값 29분이 걸렸는데, 이는 2022년 소방통계 결과인 평균 20.6분 보다[
10] 오래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응급의료접근성이 좋을수록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13] 이송시간이 짧을수록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을 기준으로 10km 이내 응급환자를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며, 가장 가깝고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12km∼13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약 30km 떨어져 있어서, 이송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항 내 공항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들의 일부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2020년 10월 1일 이후부터 12시간 진료 단축 운영을 실시하여, 미진료 시간대 발생한 환자들이 공항 밖 의료기관까지 이송되어 더욱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 중에서 여객수 기준으로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각각 두바이국제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홍콩의 책랍콕공항은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종합병원까지 약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15], 인천국제공항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천국제공항 공항구급대로 이송한 환자의 자료만 수집했기 때문에 공항의료센터에 직접 내원한 후 자가 퇴원했거나,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환자들은 본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복잡하고 넓은 시설이 많아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우며[
1] 인천국제공항 또한 복잡하고 넓은 구조를 가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보안검색이 필요한 보호구역에서 구급대를 요청하는 응급환자가 많았고 병원까지의 이송시간도 일반구역보다 오래 걸렸다. 또한 외국인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비율이 높았고, 의식수준이 내국인보다 중증도가 높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서 응급환자가 일반구역으로 이동할 때 출입국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도입하는 등 신속한 응급 이송 방안을 고려해야하고, 외국인의 언어, 신체적 특성을 이송 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긴 이송시간을 고려하여 중증처치가 가능한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동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1. 결론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특성과 이송 현황을 분석하여, 공항 내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1일까지 8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여 공항구급대가 처치 및 이송한 환자 중 중증도가 ‘응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81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가 65.6%(531명), 연령대는 50대가 19.5%(151명)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이 35.9%(289명)이었다. 발생장소는 여객터미널 내 보호구역에서 42.1%(341명)로 가장 높았다. 이송 병원의 유형 권역응급의료센터가 67.4%(505명)으로 가장 높았고, 구급 활동 시간에서 현장 도착시간, 현장 체류시간, 이송시간은 각각 중앙값이 4분, 9분, 29분이었다. 현장 도착시간은 5분 이내가 63.8%(517명), 이송시간은 30분 초과가 45.3%(339명)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의 발생장소는 보호구역에서 49.5% (143명)로 가장 높았으며, 의식수준은 반응없음의 비율이 18.3%(53명)이었고 통증자극에 반응은 11.8%(34명)로 내국인의 각각 8.7%(45명), 7.8%(4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자 발생장소에 따른 구급 활동 시간의 차이는 여객터미널 내 보호구역이 일반구역에 비해 현장 도착시간(z=-3.444, p=.001), 현장 체류시간(z=-8.145, p=.001), 이송시간(z=-3.623, p=.000)이 모두 유의 있게 길게 나타났다.
2. 제언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국제공항의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속한 응급이송을 고려해야하고, 외국인 응급환자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언어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긴 체류시간과 이송시간을 고려하여 현장과 이송 동안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 인원확보 및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며, 의사의 동승기준도 마련하여 중증환자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